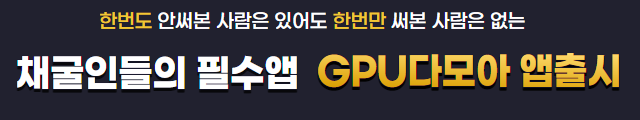GPUDAMOA
실시간 그래픽카드별 해시,채산성 정보 제공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oreo
0
04.18 01:37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가 고수해오던 정치적 스탠스를 버리고 새로운 맞춤형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오늘 (17일) ‘트럼프 관세전쟁, 어떻게 대응하나’란 제목의 좌담회를 열고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을 넘어 미국 GDP의 120%가 넘는 수준의 국가채무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이번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중국 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전략적 통제권을 회복하면서 기술 패권까지 확보하려는 목표가 있다는 데엔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관세정책은 ‘통제의 귀환’”이라며 “미국의 국가부채가 33조 달러라는 구조적 위기가 그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금리 인상, 증세, 복지 축소 모두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밖의 전략들을 본능적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닌 체제 수준의 대응이란 것이다.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제1원칙인 비차별조항(최혜국대우에 기반한 관세부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책인 만큼 결국 WTO의 실질적 탈퇴를 의미한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은 트럼프 1기 미중 관세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신속한 양자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현행 25%에서 보편관세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하고 세계적 과잉생산에 대비해 무역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됐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트럼프 관세정책이 성공하려면 중국의 보복조치, 채권·자본시장이 받을 충격, GDP·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충격, 내년 11월에 있을 미 중간선거 이후 가해질 정치 충격, 지정학적 충격 등 다섯 가지 충격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조기협상국 리스트에 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조기 협상국들 중에서도 늦게 협상에 임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제시하는 옵션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가 고수해오던 정치적 스탠스를 버리고 새로운 맞춤형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오늘 (17일) ‘트럼프 관세전쟁, 어떻게 대응하나’란 제목의 좌담회를 열고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을 넘어 미국 GDP의 120%가 넘는 수준의 국가채무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이번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중국 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전략적 통제권을 회복하면서 기술 패권까지 확보하려는 목표가 있다는 데엔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관세정책은 ‘통제의 귀환’”이라며 “미국의 국가부채가 33조 달러라는 구조적 위기가 그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금리 인상, 증세, 복지 축소 모두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밖의 전략들을 본능적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닌 체제 수준의 대응이란 것이다.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제1원칙인 비차별조항(최혜국대우에 기반한 관세부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책인 만큼 결국 WTO의 실질적 탈퇴를 의미한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은 트럼프 1기 미중 관세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신속한 양자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현행 25%에서 보편관세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하고 세계적 과잉생산에 대비해 무역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됐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트럼프 관세정책이 성공하려면 중국의 보복조치, 채권·자본시장이 받을 충격, GDP·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충격, 내년 11월에 있을 미 중간선거 이후 가해질 정치 충격, 지정학적 충격 등